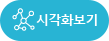| 항목 ID | GC40006023 |
|---|---|
| 한자 | 民間信仰 |
| 영어공식명칭 | Mingansinang|Folk eligion |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대구광역시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김현진 |
[정의]
대구광역시에서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전승되어 오는 신앙.
[개설]
민간신앙은 일반 민중의 생활 속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오는 자연적 신앙을 뜻한다. 민간신앙은 크게 나누어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신앙,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신신앙, 무당이 주체가 되는 무속신앙 등이 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산업화, 현대화를 거치면서 지금도 가신신앙과 마을신앙을 볼 수 있다.
[마을신앙]
마을신앙을 대표하는 것은 동제, 당제, 당산제 등으로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빌고자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동제는 대체로 정초나 정월대보름에 지내며 절차나 시기는 마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당(堂)은 마을의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신성한 공간인데, 마을 근처 언덕이나 당산나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산나무에 제단이나 당집이 함께 형성되어 있는 예도 있다. 장승이나 솟대도 당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당산나무는 마을에서 수령이 오래되어 신성시하는 나무이다. 대구 지역에도 마을마다 당산나무가 있어 해마다 정월대보름이 되면 동제를 지내왔다.
동제의 절차는 제관의 선정으로 시작된다. 제관은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하고 동제를 올릴 때까지 음식을 가려 먹고 궂은일도 모두 피한다. 동제당에는 금줄을 두르고 황토를 뿌려 부정을 막는다. 제물은 제관의 집에서 준비하고 제사 비용은 마을에서 나누어 낸다. 제의는 대체로 유교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물 진설(陳設), 헌주(獻酒), 독축(讀祝), 소지(燒紙), 음복(飮福) 순이다. 동제를 시작할 때 풍물을 치고, 제의가 끝나면 마을을 돌면서 집마다 방문하여 구석구석 돌며 지신을 밟는다. 이를 지신밟기 또는 마당밟기라고 한다. 동제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인 동시에 마을 사람들 모두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적 성격도 가진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민간신앙이 미신으로 몰려 대부분 사라졌고, 도시화로 마을공동체 개념이 약해지면서 마을 공동 제의도 간소화되거나 사라졌다. 현재 대구광역시에는 수성구 범물동, 달서구 감삼동·월성동, 서구 평리동 등 몇몇 지역에서 여전히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제의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전통을 이어 가고 있다.
[가신신앙]
가신신앙은 집안 곳곳에 존재하는 신들이 가정을 평안하게 보살펴 준다고 믿는 신앙이다. 대구 지역에 전하여 오는 가신신앙의 종류는 성주, 삼신, 조상신, 조왕, 터신, 업신, 대문신, 측신 등이다.
성주는 어느 특정 공간이나 역할보다는 집 전체를 관장하는 신이다. 집 자체를 신체로 보거나 대들보, 대청마루 등에 단지나 헝겊 같은 신체를 마련하기도 한다. 삼신은 자손 생산과 아이의 건강을 돌본다고 믿어 출산 후에 감사의 표시로 삼신상을 올리거나 아이가 아플 때 물을 떠 놓고 비는 대상이다. 조상신은 조상단지, 제석 등으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안방에 쌀을 담은 작은 단지를 신체로 모시는 형태이다. 햅쌀이 나면 단지 안의 쌀을 새것으로 갈아 넣는다. 조왕은 부엌에서 모시는 불의 신, 터신은 집터를 관장하는 신, 업신은 재운을 관장하는 신이다. 대문신은 부정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복이 들어오도록 하는 존재이고, 측신은 뒷간을 관장하는 신이다. 공간에 따라 가신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가정의 평안을 돌보는 존재로 여겼다. 가신신앙은 대구 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민간신앙이다. 현재는 도시화로 주거 공간이 변화하면서 가신신앙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속신앙]
무속신앙은 무속의 주체인 무당을 통하여 신앙이 이루어져 왔다. 무당굿은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무속 행위를 통하여 택일하거나, 병이나 액운이 없기를 바라며, 자손이 이어지기를 비는 등 우리 일상과 관련된 것들을 기원한다. 무당은 사제로서 굿을 통하여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치병과 예언의 기능도 가진다. 무당은 강신무(降神巫)와 세습무(世襲巫)로 나눌 수 있다.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고, 세습무는 선대의 무업을 이어받은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구 지역에서는 무속신앙과 관련하여 주로 삼신타기, 아이팔기, 객귀물리기 등의 의례가 이루어져 왔다. 삼신타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삼신에게 자손이 이어지기를 비는 것이다. 아이팔기는 아이 명이 짧거나 사주가 부모와 맞지 않을 때 산천이나 용왕, 칠성 등에 자식을 파는 행위이다. 객귀물리기는 상갓집을 방문하거나 외부의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때 객귀가 붙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물리칠 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무속 의례들은 흔히 이루어져 온 신앙 행위였으나 최근에는 필요에 따라서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무속인들은 주로 자신의 신당, 굿당 등에서 의례를 하고, 팔공산과 앞산 자락에서 치성을 드리고 굿을 한다. 팔공산, 앞산 빨래터, 공룡공원이 있는 고산골 등지에도 자동차고사, 굿 등 무속 행위가 전승되고 있다.
- 『대구시사(大邱市史)』 (대구시사편찬위원회·대구광역시, 1995)
- 최인학 외,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민속원, 2001)
- 『조선시대 대구의 모습』 (조선사연구회·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