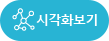| 항목 ID | GC60004573 |
|---|---|
| 한자 | 龍峰洞-高長者-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 유형 | 작품/설화 |
| 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염승연 |
| 채록|수집|조사 시기/일시 | 1989년 8월 27일 - 「용봉동의 고장자 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마을에 거주하는 김영주의 이야기를 채록 |
|---|---|
| 수록|간행 시기/일시 | 1990년 - 「용봉동의 고장자 터」 『광주의 전설』에 수록 |
| 채록지 | 용봉마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277-20
|
| 성격 | 설화|풍수담 |
| 주요 등장 인물 | 고장자|중 |
| 모티프 유형 | 풍수|인과응보 |
[정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장자와 중에 관한 이야기.
[개설]
「용봉동의 고장자 터」는 성격이 고약했던 고장자(高長者)와 도승에 관한 이야기이다.
[채록/수집 상황]
1989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용봉마을에서 김영주[남, 78세]의 이야기를 채록하였으며, 1990년 광주직할시에서 간행한 『광주의 전설』에 수록하였다.
[내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용봉마을은 예전에 평산이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용봉동이라 부르는 곳인데, 마을 안에는 고장자 터가 있고 양가 터가 있다. 고장자는 마을에서 고약한 인물로 소문이 났는데, 중이 시주를 받으러 마을에 오면 중의 바랑에 쇠똥을 한 바가지씩 줄 정도였다. 어느 날 고장자에게 망신을 당한 중이 절에 돌아가 고장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도승은 마을로 가서 상객 행세를 하면서 고장자의 집에 하룻밤를 묵었다. 도승은 신세를 진 보답으로 고장자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
용봉마을은 산 이름이 소머리란 의미의 우두뫼이고, 소집[외양간]인 우무실이 있었다. 그리고 마을 근방의 지명들도 대부분 구시시암과 통시암, 멍에시암 등 소와 관련된 지명들이었다. 그런데 도승이 "이 동네에 부자는 나왔는데 귀(貴)가 없어서 우두뫼의 뿔을 떼어내야 귀도 나고 수(壽)도 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장자는 무네미[水越]라는 곳을 자르고, 산에 있는 소머리의 귀쪽을 잘랐다. 그랬더니 산에서 사흘이나 피가 나고, 우무실에 있던 바위가 저절로 가라앉았다. 이후 고약한 고장자는 집안이 망했고, 자손 또한 대가 끊어졌다. 현재는 고장자 터인 묘만 남아 있다고 한다.
[모티프 분석]
「용봉동의 고장자 터」의 주요 모티프는 '풍수를 통한 인과응보'이다. 풍수지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땅에 일정한 경로로 돌아다니는 생기를 접하여 복을 얻고 화를 피하게 된다. 풍수지리는 철저한 윤리성과 인과응보적 특성을 지니는 사상이다. 도승은 고장자에게 거짓 정보를 주었고, 고장자는 소 형국의 산에 있는 뿔을 제거하였다. 고장자가 뿔을 자른 곳에서 산피가 나왔다는 것은 산의 혈을 잘못 잡아 땅이 흉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고장자가 패가망신했다는 결말은 윤리성과 악행으로 인한 인과응보를 상기시킨다.
- 『광주의 전설』(광주직할시, 1990)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https://www.gwangsan.go.kr)
- 국사편찬위원회(http://archive.history.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