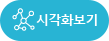| 항목 ID | GC01801524 |
|---|---|
| 영어의미역 | Song of Rice-planting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문화유산/무형 유산 |
| 유형 | 작품/민요와 무가 |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 집필자 | 김기호 |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논에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농업노동요.
울진 지역에서는 다수의 「모심기 소리」가 전해 오는데, 특이하게 ‘아침에 부르는 노래’, ‘점심때 부르는 노래’, ‘저녁때 부르는 노래’의 사설이 다르게 구성된다. 이 중 아침에 부르는 「모심기 소리」에서는 모 심기의 준비 과정이나 수확에 대한 기대를 서술하며, 점심때 부르는 「모심기 소리」는 공통적으로 점심참이 늦어지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저녁때 부르는「모심기 소리」는 청춘 남녀의 사랑이 주제이다.
1991년에 근남면 진복리의 이간남[남, 90]과 매화면 매화2리의 윤병모[남, 75], 후포면 후포리의 김말순[여, 64], 죽변면 후정리의 권천권[남, 65], 평해읍 직산리의 장완식[남, 62] 등이 부른 것을 울진군의 문화재조사연구단이 채록하여 1991년에 출간한 『울진의 문화재』에 수록하였다.
「모심기 소리」는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 부르는 교환창 방식으로 많이 불리며, 경우에 따라 독창 혹은 제창 형식의 노래도 보인다. 율격으로 보면 2음보와 3음보가 섞여서 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심기 소리」1
만경창파에 돛달은 배야/바람이 올 때를 기다린구나/옥중에 갖힌 춘향/이도령 올 때를 기다리고/요내나는 서슬한 강풍이 불 때/갔던 임은 왜 못온가/갈 때는 온다더니/온다소리 전혀없네
-아침에 부르는 노래
네귀 번들 들꼬 논에/이리 숨가[심어] 저리 숨가[심어]/집집마다 다 숨군다/에-야-어-야/골골마든 열린거는/우리 손에 달렸구나/이 논빼메 모를 숨가[심어]/장잎이 훨훨 조화로다
-점심때 부르는 소리
반달같은 점심밥은/해그넘에 달같이도 넘어온다/우리들이 이래 꽂아/이 논빼메 저 논빼매/여게 꽂이고 저게 꽂이고/이 해 넘에 넘어간다[가창자-이간남]
「모심기 소리」2
-점심때 부르는 소리
마마-마마 점심-마마/점심-참도 늦어 가네/찹쌀 닷말 밉쌀 닷말/씻고야 씻다 늦어왔네/마마 마마 점심 마마/점심참도 늦어가요/수제 닷단 간제 닷단/씻고여 씻다 늦어왔네/마마 마마 점심 마마/점심에 참도 늦어가요/어린아해 젖은 물여/먹이고하다 늦어왔소
-저녁때 부르는 소리
해 다지네 해 다-지네/이 논빼미 해-다지네/마들총각 해가 지며/어로임자 어데로 갔노/동해 동쪽 돋은 해는/일락-서산에 넘어가고/정든-임자 어디가고/저녁할 줄 왜 몰랜고(가창자-윤병모)
「모심기 소리」3
〈선창〉 이 물개 저 물개 다 헐어놓고 진디야 할려니 어데 갔노/〈후창〉 단대서라지 손데 들고 첩의 방에 놀러갔네 /무슨 첩이 유달해서 밤으로 낮으러 가노/ 밤으로 가는 건 잠자로 가고 낮으러 가는 건 놀러가네/서마지게 요논빼메 모를 숨가도 반달같네/니가 어째 반달이고 초성달이가 반달이제
-아침에 부르는 소리
〈선창〉 도리여 도래 내 친구 이실[이슬] 자자슥 내 몸 같세/〈후창〉 매화남거 꺾어들구 이실치러 내가 가네
-점심때 부르는 소리
〈선창〉 머마머마 점심머마 점심 참이가 늦어온다/〈후창〉 찹쌀닷말 맵쌀닷말 이다가보니 늦어오네/만춘산중 고사리는 점심 국거리로 다올리고/서해바다 고등어는 점심반찬에 다 올리네/머마머마 점심머마 점심 참이가 늦어오네/수제닷단 간제닷단 세리다가 늦어오네/머마머마 점심머마 점심참이가 늦어오네/아흔아홉칸 시녀들아 하홉칸 도다가 늦어오네
-저녁때 부르는 소리
〈선창〉 동해여동산 돋은 해는 일몰 서산에 넘어가네/〈후창〉 우리야 임은 어딜가고 동냥할 줄을 모리던고/해는 지고 저문날에 어떤 한 수자가 울고가노/이별행차 보내주고 이별행차가 떠나가네[가창자-김말순]
「모심기 소리」4
-아침에 부르는 소리
이논뺌에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 장할래라/〈선창〉 바다야 같은 이 논뺌에 반달말이 짓다 놨나/〈후창〉 지기야 무슨 반달이고 초승달이가 반들이자
-점심때 부르는 노래
〈선창〉 머마 머나 진에 머마 점심 참이가 늦어가네/〈후창〉 방긋 방긋 웃는 애기 젓을 주다가 늦어왔네/머마 머마 진에 머마 점심 참이가 늦어왔네/십이대문 밟고나니 점심참이가 늦어졌다/떠나온다 떠나온다 점심참이가 떠나온다/새벽같아 점심밥글 반달같이 떠나오네
-저녁때 부르는 소리
〈선창〉 해 다지고 저문날에 처녀들이 날진가네/〈후창〉 석자야 수건 목에 걸고 총각 둘이가 뒤 따르네/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는 행상이 떠나가노/이태백 볼처죽어 이별행상이 떠나간다/모시야 반 저고리 분통같은 젓좀보소/많이 보면 병이나고 손끝만치만 보고가소[가창자-권천권]
「모심기 소리」5
〈선창〉 머마 머마 중신 [점심]머마 중신 참이가 느져가오/〈후창〉 짭쌀 단말 밉쌀 단말 미나리가 다해 초단간/머마 머마 중신머마 중신 참이가 느려가오/수제갔던 추부리 다섯 글로 하여 늦어가오/이 논 빼매다 모를 숭거 가지도 벌어도 장화로다/떠나온다 떠나온다 이 정신 밭고히 떠나온다/반달 같은나 정신[점심] 밭고히 온달 같이도 떠나오네/니가야 무슨야 반달이고 초승들이가 반달이세/동해야 동천 뜨는 해 일로야 서산에 넘어가네/이 물게 저 물게 다 열어놓고 첩으야 집에 놀러갔네/무스나 첩이가 유다해서 낮에 가고 밤에 가노/낮엔들 노냐 놀러가고 밤에는 잠자러 가네/멈아 멈아 점심멈아 점심 참이가 늦어오네/찹쌀 닷말 멥쌀 닷말에 일고 일다가 늦었구나/멈아 멈아 중신멈아 중심 참이가 늦어오네/간제 닷단 수제 닷단 놓고야 놓다가 늦었구나/해야 동산에 돋은 해야 일어 서산을 넘어가네/우리내는 어데가고 해 연기 낼 줄을 모르시나/해야 적삼에 반정도에 분통 같은나 저 젓보소/해야 보면 병이 들고 죽객보고 돌아가소[가창자-장완식]
「모심기 소리」6
장새야 장새야 화장새야/기 짊어진게 그 무엇인고/장두야 창칼아 우동빈에/팔도기상[기생] 머리댕기/요논빼매 모를 숭가/가지가 벌여서 장화로다/우리야 부모님 산소덕에/솔로 숨가도 정자로다/말은 가자고 굽은 친데/임은 잡고 낙노하네/가는 나를 임일랑 잡진 말고/지는 해를 잡아매소/운애 안개 잦은 골에/그 매야 저 매야 누 맬런고/천리강산 세용가세/해 다지고 저문 날에/어떤 수자가 울고 가네/일년아 초야 간두밑에/백년야 채관을 넣고 가네/도령은 청사초롱/청사초롱에 불을 밝혀/임두야 눕두야 나도 누워/초창의 등불은 누가 키노[가창자-김분해]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모심기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