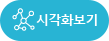| 항목 ID | GC06801230 |
|---|---|
| 한자 | 喪禮 |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정재영 |
[정의]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 절차.
[개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죽음이고 이를 처리하는 의례가 상례이다. 청송군에서는 전통적으로 죽음을 맞는 일련의 행위를 조상 숭배를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여 고인을 조상으로 승화하기 위해 오랜 기간 의례를 치렀다. 유교식 삼년상이 이러한 의례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상례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조선에서는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상례 역시 유교식으로 일원화하였다. 초기부터 숭유억불정책에 따라 7품 이하 관료에게 의무적으로 『가례(家禮)』를 시험 보게 하고,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경제육전(經濟六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의 법전을 편찬하여 모든 제도와 의례를 유교식으로 전환하였다. 상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결과 16세기 초반부터 이미 조선식 예서(禮書)들이 등장하였고, 성리학자의 예학 연구와 실학자의 실천예학 연구 등 유학자의 솔선수범으로 유교식 상례는 점차 일반화하기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유교식 상례는 완전한 조선의 상례 문화로 정착하여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화장이 도입되고, 「의례준칙」(1934)이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상복의 변화, 상례 기간의 단축 등 전통의례를 강제하면서 상례의 문화적 전통이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럼에도 1900년에 『사례편람(四禮便覽)』이 증보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출판되어 문화적 전통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1969년 대한민국 최초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함께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되고, 1999년 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현재까지 국가가 간소화를 명분으로 일생의례로서 개인의 의례를 규제하였지만, 문화적 전통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로 상례 기간의 단축, 상복의 변화 등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과 상조회사(相助會社)의 장례지도사가 상례를 대행하면서 의례의 전문 직업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절차]
상례는 고인의 시신을 처리하는 의례이지만, 대가 끊기는 위기를 극복하여 가계 계승을 정상화하는 의례적 장치이기도 하다. 초종(初終)에서 급묘(及墓)까지가 죽음을 처리하는 장사(葬事)라면, 우제에서 길제까지는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상주가 일상으로 돌아와 가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년상이라는 기간을 두었다.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졸곡(卒哭)에서 무시곡(無時哭)을 그치고,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에서 역복으로 상주의 슬픔을 경감하며, 빈소(殯所)를 철거하여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한다. 또한, 담제를 지내면서 완충 기간을 두고, 길제를 지내면서 상주의 의무를 마친 주손으로 주인의 역할을 바꾸면서 삼년상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유교식 상례의 근본은 차이가 없으나, 환경과 상황 및 지역에 따라 그 시행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청송군에서는 ‘가가례(家家禮)’라고 하여 집안, 지역, 학자에 따라 의례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생활 민속적 관련사항]
청송군 주민들은 죽음을 호상과 애장으로 분류한다. 호상은 수명을 다하여 죽은 복 받은 죽음이지만, 애장은 객사나 병사한 경우로 불행한 죽음으로 여겨 봉분이 없는 무덤을 쓴다. 선산에 묘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제강점기에는 마을 공동묘지에 무덤을 쓰도록 강제당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송군 전통 촌락들은 상례를 치르기 위한 의례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흔히 상포계 혹은 상여계라고 부른다. 전통문화가 해체되고 있는 지금도 상포계가 전승되고 있는 마을이 많다. 그만큼 사람이 죽으면 장례부터 장지에 매장하기까지 많은 일손과 협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전에는 공동재산으로 상여채를 관리하였지만, 지금은 장의사와 전문 장례식장이 발달하고, 상여를 매는 풍습이 사라지면서 흔적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 『청송군지』(청송군, 1990)
- 『한국인의 일생의례』-경상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한국일생의례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14)
- Gennep Arnold Van, 『The Rites of Passage』(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